핑계지만 요즘 정말 책을 못 읽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읽은

『공감연습』.
소설가이자 에세이스트인 레슬리 제이미슨, 그녀 자신의 상처를 포함하여 타인의 산발적 고통에 대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특유의 응시력이 인상적이었는데, 뭐랄까
(그럴 리 없겠지만) '고통'이라는 방이 있다고 할 때
이름표가 붙어있다면 우리는 최소한 심호흡이라도 하고 문을 열기 마련이겠지만 그녀의 글에는 그런 이름표가 없다. 그냥 느닷없이 방 한가운데에서 시작해 더듬거리며 한참을 두리번거린 후에야 그곳이 어딘지 알게 되는 그런 책이다. 의료 배우의 질병 연기, 거식증과 자해행위, 모겔론스 병을 앓는 사람들, 가난함, 소외, 폭력, 인종, 성별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아픔에 대한 이야기.
그녀는 말한다.
"공감은 그저 정말 힘드시겠어요 하는 말을 꼬박꼬박 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고난을 빛 속으로 끌어와 눈에 보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다. 공감은 그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답을 하게끔 질문하는 것이다. 공감에는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질문도 많이 필요하다. 공감하려면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감은 자기 시야 너머로 끝없이 뻗어간 맥락의 지평선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늙은 여인의 임질이 그녀의 죄의식과 연결되고, 그 죄의식은 그녀의 결혼과 연결되고, 그 결혼은 그녀의 자녀들과 연결되고, 그 자녀들은 그녀의 유년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은 가정생활에 숨 막혀 했던 그녀의 어머니와 연결되고, 다시 그녀 부모의 깨지지 않은 결혼과 연결된다. 어쩌면 모든 것의 뿌리는 그녀의 첫번째 월경, 그것이 수치심과 전율을 안겨주었던 방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갈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침내 말한다.
"당신은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또 다른 책이 생각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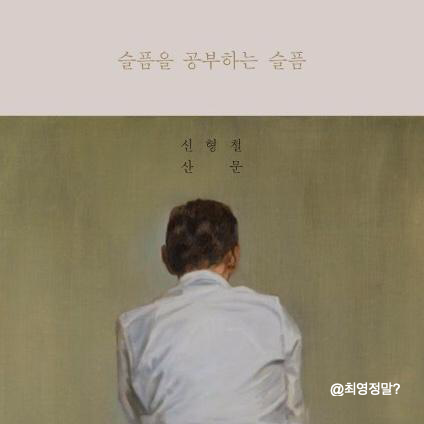
지난 해 출간된 신형철 평론가의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 책에서
그도 말했다.
"결론을 당겨 말하자면 이렇다. 어떤 책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으려면 그 작품이 그 누군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위로는 단지 뜨거운 인간애와 따뜻한 제스처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나를 위로할 수는 없다. 더 과감히 말하면, 위로받는다는 것은 이해받는다는 것이고, 이해란 곧 정확한 인식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위로란 곧 인식이며 인식이 곧 위로다. 정확히 인식한 책만 정확히 위로할 수 있다."
과연 '진리'라는 것이 있는 걸까,
하며 의구심을 품고 사는 날이 대부분이지만
이렇게 무릎을 치게 되는 이야기를 전혀 상관 없(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이들이 시공간을 넘어 한 목소리로 말할 때면 과연
있는 건가, 싶어진다.
(역시 그럴 리 없겠지만) '진리'라는 방이 있어서
그 방에 먼저 다녀와 진리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답사를 끝내고 와서는 "가서 보니 이렇더군요, 이것이 진리랍니다." 하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아무튼
우리의 그것이 적어도 0g 이지는 않도록
공감을 연습해야 한다.
슬픔을 공부해야 한다.